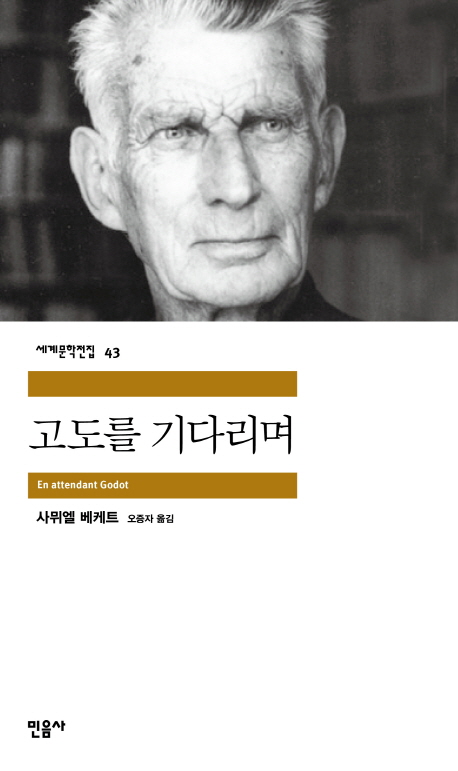
자신의 책에서 신을 찾지 말라는 말까지 남긴 사무엘 베케트였지만,
난 이 책에서 신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인간의 실존. 기괴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주인공이 쪄들어 냄새가 날 것 같은 부랑자였기 때문이었거나, 하마터면 철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나 수준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반복을 거부하지만 또 반복되고야 마는, 그리고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들의 허무한 삶 때문도 아니었다. "고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일상 때문이었다.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은 쓴 나물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른 깨끗하게 샤워라도 하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그러나 문득 그들이 갇혔던 일상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인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기괴하기만 했던 기분은 금새, 겉으론 우스꽝스럽지만 속으론 아주 깊고 묵직하게 내면을 터치당했다는 기분으로 바뀌었다.
책 전체엔 허무함이 줄줄 흐른다. 신물 나고 진절머리가 나지만 탈출할 수도 없는 그들의 일상은 마치 오래 빨지 않고 주구장창 써온 모자나, 벗어서 겨우 바람에 말리는 정도의 관리만 해서 고약한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구두 속 땀과 함께 엉겨 붙은 이물질처럼, 이미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죽음을 택하지 않는 이상,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은 없어 보였다. 절망적이다 못해 절망 자체가 그들의 호흡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도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때우는 것 밖엔 없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이 책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허무한 삶에 그나마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된다.
기다림에 지쳐 순간순간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할 때조차도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이미 허무와 절망과 한 몸이 된 그들에게 있어선 일종의 의식과도 같아 보였다. 그 기다림은 또한 그들을 유일하게 하나로 묶어 주는 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는 마치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악으로 물들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도 여전히 무언가 구원을 바라는 본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책에서 신을 찾지 말라는 말까지 남긴 사무엘 베케트였지만, 난 이 책에서 신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구원과 해방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매일 기다려도 오지 않고 고작 전령인 소년을 보내어 다음을 기약하는 "고도"라는 존재는 어쩌면 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도에게 전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는 소년은 인간의 기도를 담아가는 천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에게 자기들을 만났다고만 고도에게 전하라고 하는 두 주인공의 메시지는 절망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전하는 것 같았다.
사무엘 베케트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 나치를 피해 숨어 지내는 동안 피난민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에서 창작의 실마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고도의 정체를 포함한 이 책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전적으로 남겨 두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는 그가 겪은 인생의 부조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의미를, 비록 절망적인 현실 속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기다림"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의 모습이나 끊임없이 질적 변증을 통해 주체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실존주의적인 그의 인간관과도 맞닿아 있진 않을까.


